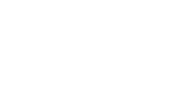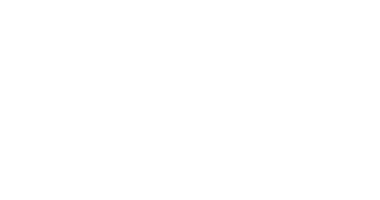EXHIBITION
EXHIBITION

Pessimistic Optimists
Artist : 유나얼
갤러리 : Space xx
전시기간 : 2020/04/08 ~ 2020/04/30
Pessimistic Optimists
작가 유나얼은 말수가 적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말을 꽤 많이 하는 순간이 있다. 자신의 창작물을 설명할 때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화자(speaker)가 될 경우도 있다. 바로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다. 직접 대면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있다. 그의 작품을 만나면 된다. 그 안에는 참 많은 말씀이 담겨 있다. 흑인, 버려진 물건, 아득한 추억으로 대표되던 유나얼의 작업에 언젠가부터 성경의 비중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보고, 즐기고, 분석하는 미술의 차원을 넘어서는 읽고 묵상하는 미술이다. “내가 좋아서 하는 창작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일인지 생각한다.” 유나얼이 작업 이야기를 할 때 자주 하는 말이다. 작가로서 활동한 시간이 쌓일수록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그리스도인은 염세주의적인 낙관론자이다.” 스페이스엑스엑스(space xx)에서의 개인전을 준비하며 작가가 처음으로 떠올렸던 문장이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다. 복음을 따르며 이미 이뤄진 것에 감사하며 산다. 충만한 삶이다. 그러나 그들은 슬프다. 세상의 죄악과 불행 때문이다. 복음을 따르는 길이 현실의 삶을 더 어렵게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 희망을 품고 살기에 비관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중적 상황에 놓인 존재다. 최선을 다해 성실히 현실을 살지만,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기다리는 존재이기도 하다.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아가서 2:10 KJV) 작가는
그러고 보니 예술가의 삶도 비슷하다. 예술가는 비관론적인 이상주의자이다. 과거로부터 그들은 보편적 미와 진리를 추구해왔다. 예술은 분명 즐거움과 행복을 전파하고 치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때때로 예술가는 세상의 어둠에 주목하고 불편함을 유발한다.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고뇌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다.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고, 시스템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위태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절망을 원해서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하기 위함이다. 불편함은 진실을 향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그길이 순탄하진 않지만 멈출 수 없다. 이처럼 행복과 불행을 함께 전달하는 예술가는 모순적 존재이다.
전시장에 들어선 관객을 압도하는 설치이자 성경 드로잉인
이즈음 유나얼의 머릿속을 맴돌던 두 번째 문장인 “어디에서 예술을 찾는가(Where Seek Art)?”를 소개해야겠다. 예술은 작가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나오는 순간 공적인 시스템 안에 놓인다. 예술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 그러나 예술은 이상에도 발을 딛고 있다. 예술은 예술가가 마주한 현실에서 시작되고 그의 내면에서 완성된다. 현실에 함몰된 예술은 창작물이 될 수 없다. 이상에만 빠져 있는 예술은 자신의 목소리를 널리 퍼트리지 못할 것이다. 예술은 현실과 이상, 외부와 내부 사이를 부유하며 곳곳을누비고 다닌다. 과연 예술이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인가? 어디에서 찾아져야 하는가? 예술은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수만 가지의 답이 나올지도 모를 질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유나얼에게 그 답은 명확해 보인다. 예술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을 평온함으로 이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것이다. 강한 어조이지만 강요하진 않는 그 묵직한 울림은 내면에 작은 파동을 일으킨다.
Where Art Thou? Whom Seek Ye?
“어디에서 예술을 찾는가?”는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했던 두 개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창세기 3장 9절의 “네가 어디 있느냐?”와 요한복음 18장 4절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이다. 전자는 인간의 원죄와, 후자는 원죄의 대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결된다. 선악과(善惡果), 그리고 생명 나무로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제거되었다. 이제
물론 유나얼의 예술은 이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이상을 향해 서 있지만 그의 시선은 현실을 살펴보길 멈추지 않는다. 그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자신이 위치한 사회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숙고한다. 이미 잘 알려졌듯 작가는 흑인 음악과 문화를 좋아한다. 어떤 의도도 없는 순수한 호감이다. 그런 마음을 고이 모아 흑인의 이미지를 작품에 담아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좋아했던 것이 미국 문화의 범주 안에 속한 흑인 음악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무언가를 좋아하려면 일단 경험해야 한다. 문화와 문화 사이의 영향 관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한편 하얀 저울 위에 놓인 오브제인
이문정(미술평론가, 연구소 리포에틱 대표)
BACK TO PAGE